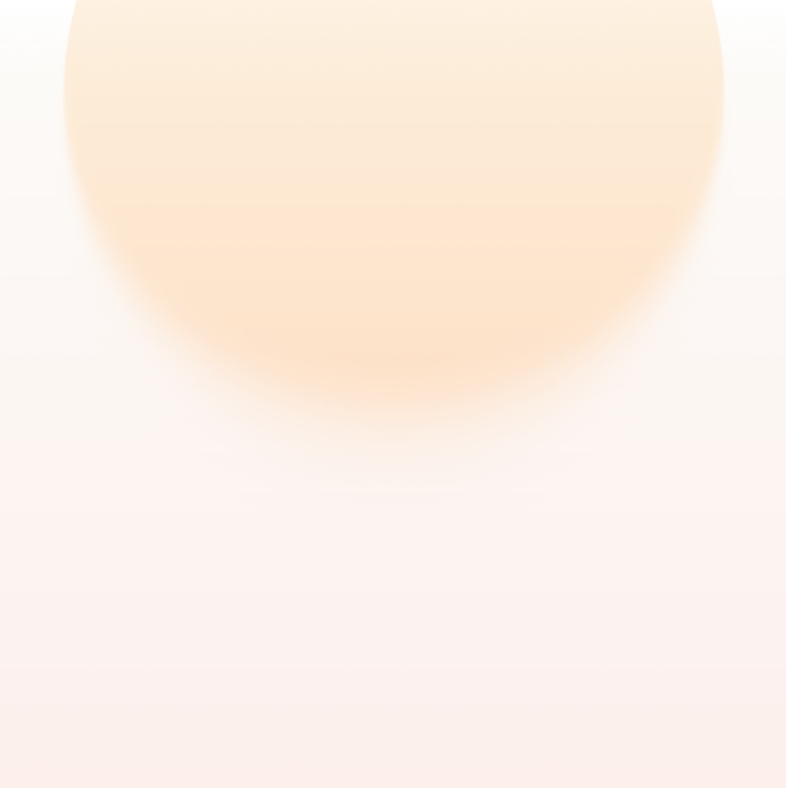이 구절에서 저자는 특정 집단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을 표현하고 있으며, 이는 당시의 역사적 및 문화적 긴장을 반영합니다. 고대 문헌에서 다양한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은 흔히 발견되는 주제입니다. '국가'로 간주되지 않는 '제3의 집단'에 대한 언급은 저자의 반감이 얼마나 깊은지를 강조하며, 특히 부적절하거나 인정받지 못할 집단으로 여겨지는 이들을 지칭합니다.
이들 집단의 특정 정체성은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 underlying 메시지는 보편적입니다. 이는 문화적, 국가적, 민족적 경계에 따라 타인을 분류하고 판단하려는 인간의 경향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대 독자들에게 이 구절은 우리 자신의 편견과 타인에 대한 유사한 감정을 품고 있는 방식을 성찰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러한 경향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과 수용의 기독교적 가르침에 부합하는 보다 포괄적이고 연민 어린 시각을 지향해야 합니다.